![[다산칼럼] 수능의 나라, 노벨의 나라](https://img.hankyung.com/photo/202511/07.38259668.1.jpg)
오는 13일 수험생 55만 명이 한날한시에 시험을 본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다. 조기 교육 과열, 천정부지인 사교육비, 무너진 공교육, 고등학교 자퇴와 n수 증가, 청소년 불안과 우울, 계층·지역 격차까지. 수많은 병폐가 드러나도 우리는 여전히 입시에 ‘올인’한다. 대학이 신분 상승 통로이기 때문이다. 공부는 더 이상 ‘앎의 기쁨’이 아니라 ‘상향 이동 수단’이 됐고 배움의 목적은 ‘무엇을 알고 싶은가’가 아니라 ‘어디에 붙을 수 있는가’로 바뀌었다.
올해 일본은 노벨상 수상자 두 명을 배출했다. 1949년 유카와 히데키 박사의 물리학상 수상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기초과학 분야에서만 27명이 상을 받았다. 그중 21명이 21세기 들어서 수상한 자다. 일본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기초과학 노벨상 강국’으로 꼽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의 20년 추이(2000~2022년)를 보면 일본은 읽기·수학·과학에서 꾸준히 상위권을 지켜온 거의 유일한 나라다. 반면 한국은 평균은 높지만 점차 하락세다. 정답 중심인 입시 교육이 한계에 이른 것이다.
2010년 이후 일본의 기초과학 수상자 12명을 보면 도쿄대(2명) 교토대(5명) 외에도 나고야대 홋카이도대 고베대 사이타마대 야마나시대 등 지방 국공립대 출신이 절반을 넘는다. 영국 THE의 2025년 일본 대학 랭킹에서 이들 대학은 7위부터 87위까지 고루 분포돼 있다. 수상자 대부분은 공립고 출신이었다. 지방대와 공교육 토양에서도 세계적 과학자가 자라난 셈이다. 의학 분야도 다르지 않다. 야마나카 신야(2012년), 혼조 다스쿠(2018년), 사카구치 시몬(2025년) 모두 의학을 전공했지만 임상이 아니라 연구의 길을 택했다. 그들에게 노벨상은 목표가 아니라 결과였다.
세계 최다 수상국인 미국은 또 다른 교훈을 준다. 공동 연구와 이민·유학생 출신 비중이 높다. 과학 진보는 개인의 천재성보다 ‘열린 연구 생태계’와 ‘다양성을 포용하는 구조’에서 비롯된다. 미국 교실은 경쟁보다 협업, 즉 함께 전략을 세우고 역할을 나누는 팀플레이형 학습을 중시한다. 반면 한국 교실은 여전히 복싱·양궁처럼 혼자 싸우는 단독 플레이형 인재를 길러낸다.
일본의 과학은 느림과 신뢰 위에서 자랐다. 수상자 평균 연령은 70세 안팎으로, 한 주제를 30~40년간 파고든 끝에 본 결실이다. 일본과학기술진흥기구(JST), 이화학연구소(RIKEN) 같은 기관은 단기 성과보다 중장기 과제 중심으로 운영된다. 실패를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연구자의 꾸준함을 신뢰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 수도권 명문대가 아니어도 연구에 몰입할 수 있던 것은 사회가 개인의 배경보다 시간의 깊이를 존중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의 연구 현장은 논문 수와 연구비가 생존을 좌우한다. 빠름이 미덕이 된 사회에서 느림은 낙오로 취급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대니얼 카너먼이 <생각에 관한 생각(Thinking, Fast and Slow)>에서 말했듯 깊은 이해와 창의는 느린 사고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수능은 느린 사고를 훈련할 수 없다. 제한된 시간에 정답을 빨리 찾는 능력만 측정하고, 사회는 그런 사람을 ‘유능하다’고 부른다. 우리는 빠름을 가르쳤지만 느림을 견디는 법을 가르치지 못했다. 느림을 견디지 못하는 사회는 결국 깊이를 잃는다.
오늘의 한국 대학은 진리 탐구 길을 벗어나 ‘간판’이 됐다. 이공계는 자연과학보다 의대를, 인문계는 문사철(문학·역사·철학)보다 로스쿨을 택한다. 교수 또한 예외가 아니다. 연구보다 외부 활동에 적극적인 폴리페서가 상아탑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 장관, 국회의원, 사외이사는 한국형 폴리페서의 3대 등용문이다. 조선시대 매관매직이 오늘날 ‘학관학직’(學官學職)으로 옮겨온 셈이다. 잦은 폴리페서의 등용은 대학을 연구의 장이 아니라 좌우 진영의 전초기지로 만든다. 보수와 진보 정권 모두 이를 개혁하기보다 필요에 따라 이용해왔다. 빈곤한 인사 철학과 얕은 학문관이 결합한 결과다.
한국은 지금 학문적으로 병든 사회다. ‘수능의 나라’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노벨의 나라로 건너가는 길은 아직 멀기만 하다.

 1 month ago
9
1 month ago
9
![[GEF 스타트업 이야기] 〈76〉“너는 너무 예민해, 너무 눈치 없어”:AI 너는 괜찮네!](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2/11/news-p.v1.20251211.f61e88e868154f18b79edb7d9f7184b6_P3.jpg)
![[정구민의 테크읽기] 모빌리티 지식재산권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2/10/news-p.v1.20251210.13c232884fc04894b24f4971de31f4ca_P1.jpg)
![[최은수의 AI와 뉴비즈] 〈31〉AI 기술 신화의 종언···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승부 가른다](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2/09/news-p.v1.20251209.040bcbca9d954de3a0a7c6bf3486898b_P3.jpg)
![[ET단상] 상시 권한 부여가 보안 위험이 되는 이유](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2/10/news-p.v1.20251210.15593fc7e9fc4bdf94c2b0a4d34d1193_P3.jpg)
![[김장현의 테크와 사람] 〈90〉더 이상 개인정보라고 부르지 마라](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2/10/news-p.v1.20251210.f8ad56fc8e26477981cbc0aa5a7e163e_P3.jpg)
![[ET시론] 반복되는 '연말 택시대란'…모빌리티 플랫폼의 과제](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2/10/news-p.v1.20251210.0e07b8c53a964939a3dd0422d70e9348_P3.jpg)
![[기고] AI 패권 시대,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의 성공 조건](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2/09/news-p.v1.20251209.a454e13faffa4277986c1ef1e2dbb89b_P3.jpg)
![[부음] 김정겸(충남대학교 총장)씨 모친상](https://img.etnews.com/2017/img/facebookblank.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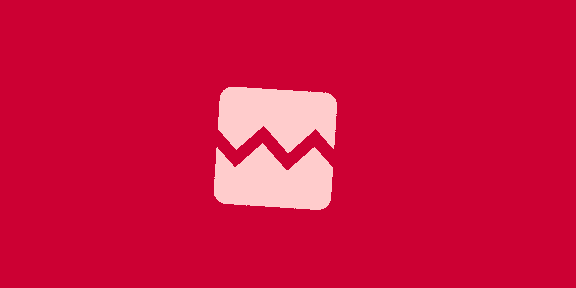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