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칼럼] 빵지순례](https://img.hankyung.com/photo/202511/AA.42476031.1.jpg)
‘빵지순례’라는 말이 쓰이기 시작한 건 10여 년 전부터다. 검색을 해보니 언론에서는 2013년 처음 기사에 등장했다. 열정적인 초기 순례자들 덕분이겠지만 빵지순례는 이제 하나의 거대한 트렌드가 됐다. 인스타그램에는 빵지순례란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과 한 입 베어 물고 싶은 빵 사진이 셀 수 없을 만큼 넘쳐난다. 지역에서나 알아주던 빵집들은 전국구 인기 맛집으로 발돋움했고 동네의 숨은 고수들이 조용히 빵을 굽던 가게들도 차례차례 ‘빵의 성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유명 빵집은 지역 관광을 살리는 역할도 한다. 전국구 빵집엔 빵 자체가 목적인 ‘순례자’는 물론 여행 선물로 빵을 사 가려는 관광객이 넘쳐난다. 지역의 관광 매력이 그만큼 풍성해진 셈이다. 대표적인 도시가 대전이다. 주말엔 시티투어버스가 성심당 등 지역 유명 빵집을 도는 ‘빵시투어’를 운영할 정도다. 대전은 이제 ‘과학의 도시’보다 ‘빵의 도시’로 더 유명하다. 몇 달 전 휴가 때 찾은 군산의 이성당과 전주의 PNB풍년제과도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보통의 여행자가 시간을 쪼개 찾아갈 정도로 빵집은 이제 어엿한 지역 명소가 됐다. 빵지순례가 주머니 가벼운 청년들의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여행’이라지만 양손 가득 빵 봉투를 든 사람들을 보니 매출액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았다. 지역경제 역시 웃을 수밖에 없다.
대체 데이터 플랫폼인 한경에이셀(Aicel)의 분석에 따르면 커피·베이커리·패스트푸드 업종의 카드 결제액이 10년 새 80% 증가해 올해 12조원대를 기록할 것이라고 한다. 매년 새로 생겨나는 빵집도 4000개가 넘는다. 반대로 차별화, 고급화를 못 하는 동네 빵집은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고도 할 수 있다.
최근 도시 외곽에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속속 들어서는 이유 중 하나가 자산가들의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라고 한다. 빵집은 최대 600억원까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의도가 어쨌든 ‘빵지’가 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면 마냥 비난만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김정태 논설위원 inue@hankyung.com

 2 weeks ago
6
2 weeks ago
6
![[김순덕 칼럼]지리멸렬 국민의힘, 입법독재 일등공신이다](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12/09/132934565.1.jpg)
![9번째 중도 사퇴… 교육과정평가원장 잔혹사[횡설수설/우경임]](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12/10/132942824.3.jpg)
![[오늘과 내일/김재영]‘청탁 문자’가 알려준 낙하산 공습 경보](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12/10/132943091.1.jpg)
![[광화문에서/박성민]일본, 외국인 방문돌봄 허용… 한국은 얼마나 준비됐나](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12/10/132943088.1.jpg)
![AI 시대 연구와 교육, 활용 금지서 투명성 확보로[기고/유상엽]](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12/10/132943055.1.jpg)
![쾌락의 청구서[이은화의 미술시간]〈400〉](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12/10/132940967.5.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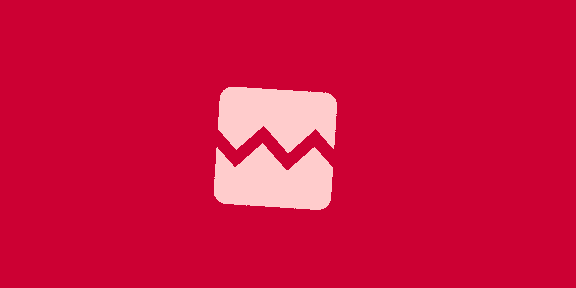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