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캡처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선임기자 = 현재 방영 중인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가 중장년 남성들 사이에서 화제라고 한다. 이 드라마는 가족극 형식을 띠고 있지만, 가장(家長)의 '불안'을 집중 조명하고 있다. 서울에서 자가(自家)를 보유하고 대기업 부장이란 타이틀을 가진 50대 김 부장은 한국 사회에서 제법 성공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퇴직 공포와 가족 생계를 늘 걱정해야 하는 편두통 같은 현실이 있다. 김 부장은 허구지만, 그의 흔들림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중장년들의 '진동(震動)'과 같다.
현실은 드라마보다 훨씬 혹독하다. 대기업 곳곳에서 희망퇴직 제안이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있다. 예전처럼 만 55세 이후 조용히 다가오던 절차가 아니다. 일부 정보기술(IT)·게임·유통 기업에선 30대 후반까지 희망퇴직 대상을 넓히는 사례도 나타났다. 구조조정의 범위가 대폭 확장된 것이다. 최근 대기업 인사에서도 세대이동이 두드러졌다. 50·60대는 빠르게 퇴장했고, 70년대생은 중역으로, 80년대생은 핵심 실무진으로 각각 올라섰다. 실제로 CJ그룹은 36세 여성 2명을 포함해 30대 임원 5명을 발탁하며 '젊은 리더십'의 흐름을 보여줬다. 기업들은 더 젊은 세대, 더 빠른 결정을 선택하고 있다.
여기엔 고착화하고 있는 경제 침체와 첨단기술 도입이란 '복병'이 숨어 있다. 경기 둔화가 길어지면 기업은 비용을 줄이고 조직을 축소한다. 게다가 인공지능(AI)의 확산으로 변화의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보고·조율·관리 업무가 자동화되면서, 중장년 관리자들은 익숙했던 역할이 급격히 바뀌고 있음을 몸소 체험하고 있다. 혁신이란 이름으로 구조가 바뀌고, 효율이란 명목으로 역할이 재편되고 있는 것이다. 드라마 속 김 부장의 불안은 과장이 아니라, 시대 변화가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결과다.
이런 흐름과는 별개로 정부는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정년 제도가 실효성을 갖는 영역은 공공기관과 일부 제조업에 한정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대기업 사무직은 형식적 정년이 60세여도 대부분은 40대 후반∼50대 초반 희망퇴직·조직개편 등으로 일터를 떠나는 게 현실이다. 정년을 65세로 늘린다고 해서 대기업 사무직이 더 오래 안정적으로 일하는 구조가 될지는 의문이다. 결국 실질 고용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대상이 다르면 해법도 달라야 한다.
특히 한국의 50·60대 장년들은 구조 전환기의 중심에 서 있다. 기업은 젊어지고 있고, 오랜 경력을 예전만큼 대접해주지 않는다. 게다가 AI는 기존 역할까지 흔들고 있다. 그렇다고 이들의 경험을 그대로 묻어두기엔 아깝다. 문제는 그 연륜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배치할 것인가다. 산업별·직군별로 다른 고용구조를 구분해 정책을 설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퇴직과 전직을 단절이 아닌 후속 단계로 이어지도록 재교육·전환 지원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중장년의 숙련된 역량을 사회적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경로를 구축해야 할 시점이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5년11월20일 06시30분 송고




![머리카락보다 얇고 인체 완벽 밀착…'THIN'이 신체 모니터링 [지금은 과학]](https://image.inews24.com/v1/54dfa03c1c4322.jpg)

![SK하이닉스 "엔비디아와 차세대 SSD 개발 중…속도 최대 10배 빠르다" [강해령의 테크앤더시티]](https://img.hankyung.com/photo/202512/01.42641375.1.jpg)


![[주간스타트업동향] 칼렛바이오, 상표 ‘REPULP’로 2025 상표·디자인권전 동상 수상 外](https://it.donga.com/media/__sized__/images/2025/12/10/5088c5d08e954c1d-thumbnail-960x540-7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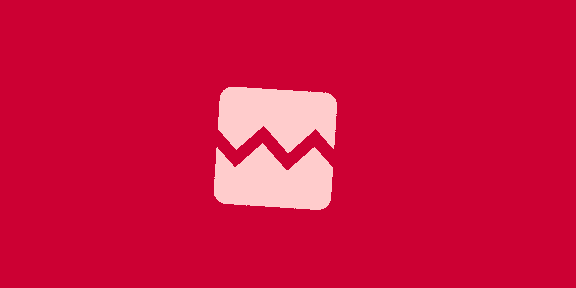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