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상 제향은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까지 4대만 모시도록 규정돼 있었다. 조선이 처음 종묘를 세울 때도 태조 이성계의 4대조인 목조 이안사, 익조 이행리, 도조 이춘, 환조 이자춘을 모셨고, 이후 이들의 신주는 영녕전으로 옮겨졌다.
원래는 4대조까지만 제향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위대한 왕들의 제사를 종묘에서 옮겨버릴 수 없다는 부담 때문에 예외가 생겼다. 이렇게 종묘에서 계속 모시는 신주를 ‘불천위(不遷位)’라고 한다. 반면 불천위에 들지 못한 왕의 신주는 영녕전으로 옮겼다.
태조는 고려 시대 소격전이 있던 자리를 종묘 터로 정했다. 터를 잡은 지 정확히 1년 뒤인 1394년 12월 4일에야 공사가 시작됐고, 다시 1년이 지난 윤9월에 4대조 신주를 모실 수 있었다. 하지만 2대 정종 때 한양에서 개경으로 환도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통치는 개경에서 했지만, 종묘는 한양에 있었기 때문에 종묘에서 제사를 지내야 할 때마다 왕이 한양으로 행차해야 했다. 이게 너무 불편해서 개경에 새 종묘를 만들자고 했으나 태종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태종 5년에 다시 한양으로 천도했는데, 이때 내세운 천도의 명분 중 하나가 종묘와 사직이 한양에 존재한다는 점이었다. 그만큼 종묘는 조선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조선은 나라에서 지내는 제사를 대중소로 나눴는데, 대사는 종묘와 영녕전, 사직에 올리는 제사였다. 이처럼 종묘제례는 가장 중요한 국가 행사였다.우리가 ‘종묘’라고 부르는 공간은 사실 여러 건물을 아우른 것이다. 영녕전은 불천위가 아닌 조선 왕실의 사람들을 모시는 곳이고, 입구에는 고려 공민왕의 사당도 자리하고 있다. 종묘 정전 맞은편에는 각 왕의 공신을 모신 공신당, 그리고 나라를 보호하는 일곱 신을 모시는 칠사당이 있다.
칠사당의 일곱 신은 각각 수명을 담당하는 사명(司命), 출입을 지키는 사호(司戶), 음식을 주관하는 사조(司造), 거처를 맡는 중류(中霤), 도성의 문을 관장하는 국문(國門), 후손 없는 이의 원한과 형벌을 관리하는 공려(公厲), 도로의 신인 국행(國行)이다. 공신당에는 조준, 황희, 이황, 이이, 김상헌, 민영환 등 익숙한 이름의 신하들이 모셔져 있다.
종묘가 처음부터 지금의 형태를 갖춘 것은 아니었다. 왕이 승하할 때마다 사당을 하나씩 늘려 오늘의 모습이 만들어졌다. 조선의 역사가 켜켜이 담긴 공간인 셈이다. 최근 세운상가 재개발 논의 과정에서 ‘경관 문제’를 이유로 종묘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말들이 나온다. 정치적인 이유로 문화유산을 폄훼하지는 말자. 종묘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도시 개발과 조화를 이루는 길을 찾는 것이 우리가 고민해야 할 방향이다.이문영 역사작가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6 days ago
2
6 days ago
2
![[이소연의 시적인 순간] 내가 가장 먼저 안 '첫눈'](https://static.hankyung.com/img/logo/logo-news-sns.png?v=20201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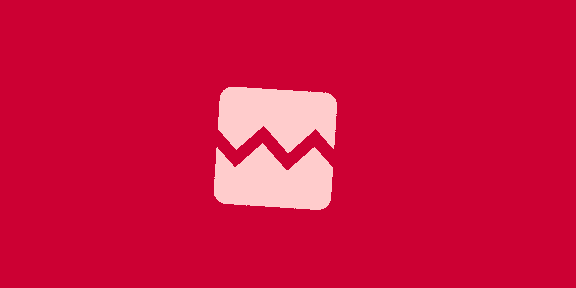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