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칼럼] 12·3 계엄의 기억](https://img.hankyung.com/photo/202512/07.40002829.1.jpg)
벌써 일 년. 브라운아이즈가 2001년 발표해 인기를 끈 노래 제목이다. “벌써 1년이 지났네” 하고 생각하다 보니 문득 떠오른 곡일 뿐 음악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다. 1년 전 오늘 사실상 처음 겪은 기이하고도 허탈한 계엄 얘기다. 1979년에서 1980년으로 이어진 비상계엄은 철모르던 시절이라 거의 기억에 남아 있지 않다. 다만 공포라는 감정은 몸에 새겨져 있다. 우리 사회가 아직 선명하게 가지고 있던 계엄에 대한 집단 기억 때문일 것이다.
그날따라 퇴근 후 ‘모바일 디톡스’를 한다고 자정이 다 돼서야 휴대폰을 들여다보니 카카오톡 단톡방이 난리가 나 있었다. “도대체 왜”라는 탄식과 함께 결국 잠 못 드는 밤이 됐다. 2024년의 계엄엔 공포보다 당혹이 앞섰다. ‘일체의 정치 활동 금지’ ‘전공의 등 미복귀 시 처단’ 같은 포고령 문구를 보며 혹시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한 ‘몰래카메라’가 아닐까 의심했을 정도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이 모두 같을 수는 없다. 누군가는 황당함으로, 누군가는 분노로, 또 다른 누군가는 ‘계몽의 순간’으로 기억할지 모르겠다. 그래도 공통적인 건 그 짧았던 6시간 이후 우리 사회가 너무나 많은 일을 숨 가쁘게 겪어야 했다는 사실이다.
광장은 찬탄과 반탄으로 갈라졌지만,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결론을 냈다. 헌재의 탄핵 결정 전엔 관저에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이후엔 구치소 독방에서 ‘농성’하는 그의 모습은 애잔했다. 영락없이 풍차를 향해 돌진하다가 주저앉은 돈키호테 같았다. “저건 괴물이 맞다”고 속삭인 산초도 있었을 테지만 본질적으로는 자신이 가진 품성과 능력에 맞지 않은 자리에 오른 때문이다. 계엄이라는 ‘어퍼컷 한 방’으로 정치적 난관을 뚫으려다 자멸한 탓에 국민과 기업만 힘들었다.
어쨌든 계엄의 최대 수혜자는 3년 만에 정권을 되찾은 지금의 여권이다. 천운 같은 조기 대선이 이뤄졌고 도저히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았던 4중, 5중의 사법 리스크를 뚫은 대통령도 탄생했다. 양손에 입법·행정 권력을 쥔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사법 권력까지 손에 넣으려는 중이다. 내란전담재판부, 법 왜곡죄 도입 등 거침이 없다. 위헌 논란이 쏟아져도 ‘내란 척결’이라는 여의봉을 손에 쥐고 있으니 별 신경 쓰지 않는다. 공격과 방어에 자유자재인 절대무기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내란 가담 공무원 색출에도 나섰다. 3대 특검이 별 성과 없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자 이제는 ‘2차 종합특검’을 들고나올 태세다. “이대로 끝낼 수 없고, 이대로 끝내지 않을 것”이라는 당 대표의 말이 잘 벼린 칼처럼 서늘하다.
국민의힘은 정반대다. 하루아침에 여당의 지위를 잃었고 ‘내란당’으로 찍혀 해산 위협까지 받고 있다. 그래도 보수의 희망이어야 할 국민의힘은 점점 보수의 절망이 돼 가고 있다. 계엄을 사과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지금까지 집안싸움 중이다. 여당의 독주를 막기는커녕 1년이 지나도록 계엄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이다. 야당 노릇조차 제대로 못 하니 일방통행식 정치가 계속된다. 그 폐해가 작지 않을 것이다.
“일 년 뒤에도 그 일 년 뒤에도 널 기다려”라는 가사처럼 사랑의 기억이야 떠나보내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계엄은 다르다. 이제는 그만 차분한 일상을 되찾고 싶다는 사람도 적지 않다. 남은 진상 규명과 단죄는 법적 절차에 맡기면 그만이라는 얘기다.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주리를 틀겠다는 여당의 집요함이나 제 살길 찾기에 바쁜 야당의 무기력함이나 답답한 건 마찬가지다. 그래도 1년 만에 계엄의 충격과 혼란을 이겨내고 나라를 정상 궤도로 되돌린 우리 국민의 저력만큼은 감탄스럽다. 리더와 정치인들만 잘하면 아무 걱정이 없는 나라다.

 1 week ago
4
1 week ago
4
![[이소연의 시적인 순간] 내가 가장 먼저 안 '첫눈'](https://static.hankyung.com/img/logo/logo-news-sns.png?v=20201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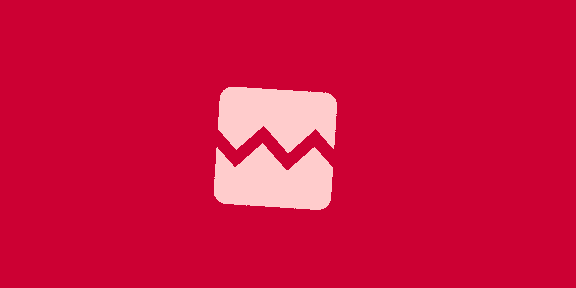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