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은 치매, 뇌졸중, 편두통과 함께 국내 4대 만성 뇌질환으로 꼽히는 주요 신경계 질환이다. 세계 인구 약 1%가 앓고 있어 비교적 흔한 질환으로 분류된다. 과거에는 ‘간질’이라 불렀으나, 2010년 질환에 대한 오해와 낙인을 줄이기 위해 ‘뇌전증’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쓰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뇌전증 환자 수는 2020년 이후 매년 증가해 2022년 기준 15만 명대에 이르렀다.
저혈당, 저나트륨혈증, 알코올 금단 등과 같은 뚜렷한 유발 요인 없이 발생하는 ‘비유발성 발작’이 24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두 차례 이상 반복될 경우 뇌전증으로 진단한다.
변정익 강동경희대병원 신경과 교수는 “뇌전증은 발작의 종류와 발생 부위에 따라 치료 반응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환자 특성에 맞춘 정확한 분류와 치료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뇌파·MRI 검사가 핵심
뇌전증의 의학적 정의는 자발적 발작이 하루 이상 간격을 두고 두 번 이상 나타나거나 한 번의 자발적 발작이 있더라도 뇌영상에서 이상이 있거나 뇌파에서 경련파가 확인되는 등 유사한 발작이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을 말한다. 이를 위해 발작이 언제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발작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상 의료진이 현장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우며 환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호자가 증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병력 청취와 문진이 중요하다.
보호자가 발작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기억해 두거나, 가능하다면 발생하는 증상을 핸드폰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여주는 것이 정확한 진단에 큰 도움이 된다. 이를 바탕으로 뇌전증 여부를 판단하고 실신 등 다른 질환과의 감별을 진행한다.
◇ 80%는 약물로 조절 가능
뇌전증 치료는 약물로 시작한다. 전체 환자의 약 70~80%는 항발작제 복용만으로 발작이 충분히 조절된다. 현재 20종 가까운 항발작제가 사용되고 있으며 본인에 맞는 약물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 항발작제는 환자별 맞춤 선택이 중요하며, 부작용 발생을 막고 안정적인 치료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용량부터 점진적으로 증량해 적정 유지 용량을 결정하게 된다.
약물 사용 중에도 경련이 반복된다면 약물 용량을 늘리거나 다른 기전의 약물을 추가하게 된다. 두 가지 이상의 항발작제를 충분한 용량으로 써도 발작이 지속되는 ‘난치성 뇌전증’은 수술 치료를 검토한다.
뇌전증은 금주,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조절 등 자가 관리가 필수적이다. 식사를 거르더라도 항발작제는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복용해야 하며, 복용이 늦어졌더라도 가능한 한 복용하는 게 좋다.
변 교수는 “뇌전증은 적절한 약물치료와 올바른 생활 습관이 병행되면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질환”이라며 “모든 치료 결정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4 hours ago
1
4 hours ago
1

![[기획] 양자컴퓨터가 '코인' 암호도 뚫는다던데... 진짜?](https://it.donga.com/media/__sized__/images/2026/2/10/6c210f134d544ceb-thumbnail-960x540-70.jpg)
![[자동차와 法] ADAS가 사고 내고 책임은 사람이 진다...과실비율의 사각지대](https://it.donga.com/media/__sized__/images/2026/2/10/416b3147710f4be7-thumbnail-960x540-70.jpg)
![[컨콜종합] 1600억원 벌어들인 '아이온2'…엔씨소프트 자존심 살렸다](https://image.inews24.com/v1/70c6f9900ae721.jpg)
![이통3사 영업익 4조 회복…해킹 직격탄 SKT 주춤, KT·LGU+ 역대급[종합]](https://image.inews24.com/v1/a4f4265e5435cd.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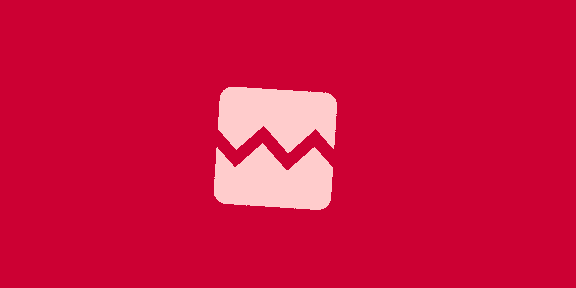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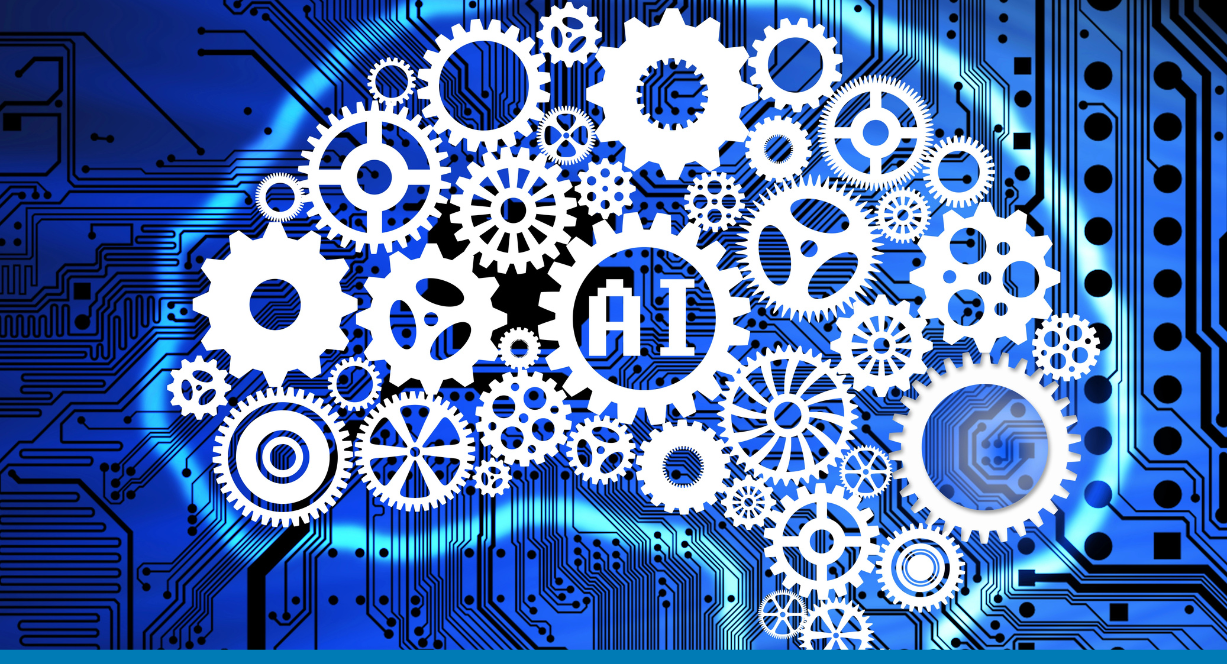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