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칼럼] 금융계급제라는 오해](https://img.hankyung.com/photo/202511/AA.42395164.1.jpg)
주로 금융권에서 사용되지만 ‘신용’이라는 용어가 현대 경제시스템에서 갖는 무게감은 남다르다. 신용 없이는 거래는 물론 시장도 존재하기 어렵다. 경제를 돌리는 혈액 격인 화폐조차 국가 신용에 따라 가치가 좌우된다.
신용은 경제 성장의 알파요 오메가이기도 하다. ‘신용 수준이 높아야 성장이 촉진된다’는 명제는 반박 불가다. 의미를 최대로 확장하면, 신용이야말로 현대 경제시스템을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다. 유발 하라리가 근대와 현대 경제시스템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신용에 대한 입장 차이’를 제시한 배경이다. 개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다. 신용도는 성실성·책임감의 지표로 간주되며, 누군가의 신용은 곧 그의 정체성이다. ‘신용이 사라지면 당신도 사라집니다’라는 광고 문구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신용등급을 ‘금융계급’에 비유했다. “가난한 사람에게 비싼 이자를 강요하는 현재 금융제도는 금융계급제”라고 질책하며 금융개혁을 강조했다.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이라던 두 달 전 언급에 이은 금융계급제 발언에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다. 신용등급 최하위 그룹의 대출금리가 차상위자 그룹보다 0.4%포인트까지 낮아졌다. 비상식적 ‘금리 역전’은 은행권 전반에서 목격된다.
“한 해 수조원씩 버는 금융권이 금리 좀 깎아준다고 탈 나지 않는다”는 게 대통령 설명이다. 현대 경제시스템에서 신용이 갖는 무게감을 고려하면 당혹스럽다. 핵심 가치를 무너뜨리는 작은 날갯짓이 신용 실종이라는 거대한 태풍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계급’이라는 단어에서 풍기는 대결적 함의도 우려된다. 계획주의 진영에서 시장주의를 공격하는 개념이 ‘계급사회’다. 약자 보호와 마찬가지로 신용 사회도 훼손 불가의 절대 가치다. 서민 보호는 민간 기업이 아니라 국가 복지의 영역이다. 정책금융 강화로 지원·재활을 강화하는 방식이 정석이다. 100조원 넘는 적자 국채의 최우선 투입을 지시한다면 반대할 국민이 없을 것이다. ‘현대 시장경제는 신용의 호수에 떠 있는 배’(빈기범 명지대 교수)와 같다. 신용의 호수가 말라붙으면 배도 옴짝달싹 못 한다.
백광엽 수석논설위원 kecorep@hankyung.com

 3 weeks ago
7
3 weeks ago
7
![[한경에세이] 플랫폼과 은퇴자의 아름다운 동행](https://static.hankyung.com/img/logo/logo-news-sns.png?v=20201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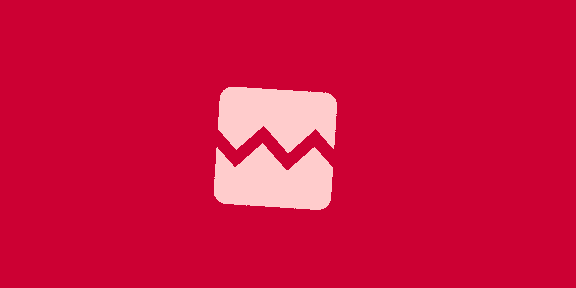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