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칼럼] 정쟁에 휩쓸린 '감사의 정원'](https://img.hankyung.com/photo/202511/AA.42418001.1.jpg)
광화문광장은 서울의 중심이다. 곧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간이라는 말이기도 하다. 더구나 청와대 복귀가 코앞이니 그 상징성이 낮아질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 같다.
영국 런던의 트래펄가 광장, 프랑스 파리의 콩코르드 광장 등과도 비교할 수 있겠다. 하지만 굳이 찾아가고 싶은 공간이냐고 묻는다면 솔직히 그렇다고는 못 하겠다. 늘 어수선하게 공사 중이거나 그도 아니면 온갖 시위의 소음이 거슬렸던 예전 기억 때문이다. 얼마 전엔 버스를 타고 지나다가 광장의 안락한 의자에 앉아 책 읽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놀랐다. 이곳이 이렇게 평화로운 풍경일 때도 있구나 하고. 그런데 역시나, 평화는 짧다. 광장은 정치에 오염되기 쉽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6·25 참전 22개국을 기리기 위해 조성하는 ‘감사의 정원’에 정부와 여당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그제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는 “광화문은 대한민국의 얼굴이며 대표적 국가 상징 공간이자 문화국가의 미래 상징이다.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을 모신 광화문에 굳이 ‘받들어총’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술 더 떠 “광장의 정체성을 군사주의적이고 외세 의존적으로 퇴색시키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집총 경례’를 모티브로 한 건 맞지만 유엔군 참전 용사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표시하기 위한 조형물이라는 게 서울시의 반론이다. 꼭 광화문에 그런 상징물을 세워야 하느냐는 이견이야 있을 수 있다. 광장을 ‘비움’의 공간으로 놔두지 않고 채우려고 하는 것도 논란의 여지는 있다. 하지만 군사주의, 외세 의존까지 들먹이는 건 너무 나갔다. 75년 전 15만 명의 사상자를 낸 유엔군의 희생이 없었다면 광화문광장은 평양 김일성광장처럼 적화의 한복판이 돼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시점도 의문이다. 조성 계획 발표가 지난 2월 났으니 공사 착수 전 문제를 제기할 기회는 충분했다. 결국 종묘, 한강버스에 광화문까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이어지는 ‘오세훈 견제구’ 아니냐는 의심을 살 만하다. 마침 서울시장 등판설이 꺼지지 않는 김 총리가 어김없이 주연으로 등장하니 더 그렇다.
김정태 논설위원 inue@hankyung.com

 3 weeks ago
8
3 weeks ago
8
![[한경에세이] 플랫폼과 은퇴자의 아름다운 동행](https://static.hankyung.com/img/logo/logo-news-sns.png?v=20201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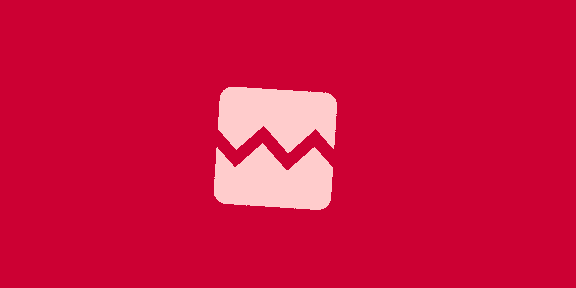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