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인명피해 통계조차 없는 스토킹 범죄](https://img.hankyung.com/photo/202511/07.40243199.1.jpg)
지난 7월 26일 오후 5시10분께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의 한 노인복지센터에서 홀로 일하던 50대 여성 A씨가 건물 5층 화장실 앞에서 마주친 60대 남성 B씨의 흉기에 찔려 숨졌다. B씨는 A씨와 과거 직장 동료 사이였다. B씨는 퇴사 후에도 지속적으로 A씨를 찾아와 행패를 부리거나 문자를 보내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의 긴급 응급조치가 내려진 상태였다.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6일 전까지 총 세 차례의 신고가 있었다. 경찰은 긴급 응급조치보다 강력한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의 잠정 조치를 내려달라고 했으나 검찰은 이를 기각했다. 수사기관의 허술한 대응이 비극으로 이어진 사례다.
경찰이 긴급 응급조치를 했지만 스토킹이 살해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의정부 사건 외에도 6월 대구, 7월 울산에서 응급조치로 신변 보호를 받고 있던 피해자 두 명이 스토킹범에게 살해됐다.
스토킹은 살인이나 폭행으로 번지기 쉬운 범죄지만 정작 인명피해 현황에 대해선 국가 차원의 통계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경찰청은 스토킹 관련 신고나 사건 발생 건수만 다룰 뿐 이로 인해 강력범죄가 얼마나 발생했는지는 관리하지 않고 있다. “스토킹 범죄에 따른 사망·부상 등 인명피해 건수는 범죄시스템상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이 경찰의 공식 답변이다. 국회에서 “스토킹 범죄로 인한 사망자 수조차 집계되지 않는 현실은 범죄 방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기초 통계가 없어 연간 1만 건이 넘는 스토킹 범죄가 어떤 방식으로 강력범죄로 이어졌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스토킹 통계 사각지대가 제대로 메워지지 않으면 스토킹을 경미한 갈등으로 취급하는 인식 또한 쉽게 바뀌기 어렵다. 교통사고,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은 인명피해 통계를 세부적으로 집계하기 시작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벌써 4년이 지났다. 그사이 범죄 발생 건수는 13배 늘었지만 대응은 제자리다. 경찰청이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는 2021년 1023건에서 지난해 1만3283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법원이 스토킹범에게 위치 추적 장치 부착·구치소 유치 등을 명령하는 피해자 보호조치인 잠정 조치 역시 869건에서 9868건으로 11배 늘었다.
스토킹 전담 경찰관은 전국 293명이다. 폭증하는 신고 건수를 감당하기엔 부족한 숫자다. 우선순위에서 밀려 전담 경찰관을 증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스토킹이 살해로 번지는 비극을 막는 노력은 범죄 심각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 구축에서 시작돼야 하지 않을까.

 2 weeks ago
6
2 weeks ago
6
![[한경에세이] 플랫폼과 은퇴자의 아름다운 동행](https://static.hankyung.com/img/logo/logo-news-sns.png?v=20201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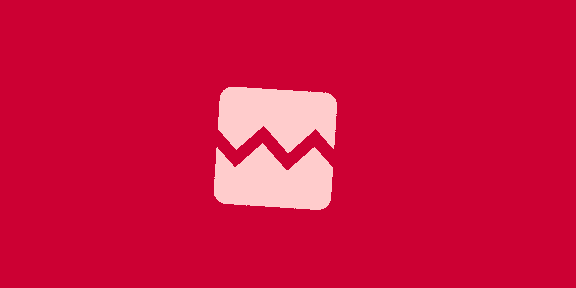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