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경계에 선 사람들](https://img.hankyung.com/photo/202511/07.42301768.1.jpg)
지난해 ‘사상검증구역: 더 커뮤니티’라는 정치 서바이벌 예능에 참여했다. 공동 재정을 확보하고,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는 구조였다. 공동체의 운영 방식과 생존을 고민해야 했던 그 공간에서 현실 정치보다 더 날것의 갈등이 빚어졌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비 오는 날 우산을 쓴 낯선 외국인의 등장이었다. 우리는 그를 공동체 구성원으로 받아들인다면, 함께 쌓아온 재정에서 정착금을 지원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나는 공동체 구성원이 된 외국인에게 “당신이 받게 될 정착금은 우리가 함께 모은 돈”이라고 분명히 알렸다. 일부 참여자는 왜 굳이 그런 말까지 하느냐며 불편해했다. 하지만 연민만으로 기준 없이 이민자를 받아들이면 결국 공동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회의원이 된 지금, 그때의 갈등을 현실에서 마주하고 있다. 이미 한국 사회에는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결혼이민자 등 다양한 형태의 이민자들이 자리 잡았다. 그 과정에서 형평성과 부담을 둘러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예능이나 현실 정치에서나 내 기준은 같다. 국민이 낸 세금은 국민을 위해 쓰는 게 원칙이고, 한국 사회에 들어오는 외국인에게는 명확한 요건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얼마 전 정부의 빚 탕감 정책으로 논란이 일었다. 탕감 대상에 외국인 2000여 명이 포함되고 그 규모가 182억원에 달해서다. 나는 “국민의 세금이 국적조차 불분명한 외국인의 채무 탕감에까지 쓰이는 게 타당한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외국인 채무자만을 겨냥한 공격이 아니다. 공동체의 자원을 배분할 때 어떤 기준이 필요하며, 그 기준이 상식과 형평성에 부합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다.
포용은 필요하다. 하지만 ‘없는 살림에 이것저것 퍼주다 집안이 기운다’는 말처럼, 원칙 없는 포용은 오히려 공동체를 위태롭게 만든다. 미국 등 개방성과 다양성으로 성장한 나라들도 그 기반에는 분명한 기준과 사회 통합 시스템이 있었다. 한국 역시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 문제를 고려하면 이민에 대한 논의를 피할 수 없지만, 기준 없는 수용은 인도주의가 아니라 무책임일 뿐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책임과 포용이라는 두 축 사이에서 현실에 맞는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할 시점에 서 있다. 이민은 단순히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자국민과의 형평성, 재정 부담, 사회적 수용성, 문화적 통합 가능성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한 원칙이 필요하다.
우리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우선시하면서도, 공동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외부 인재와 변화를 수용할 정교한 기준이 필요하다. 작은 제도 하나에서도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조율해야 하고, 그 과정에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설명과 사회적 합의가 뒤따라야 한다. 앞으로도 나는 책임과 포용 사이에서 지속 가능한 균형점을 국회와 현장에서 찾아가고자 한다.

 2 weeks ago
7
2 weeks ago
7
![[한경에세이] 플랫폼과 은퇴자의 아름다운 동행](https://static.hankyung.com/img/logo/logo-news-sns.png?v=20201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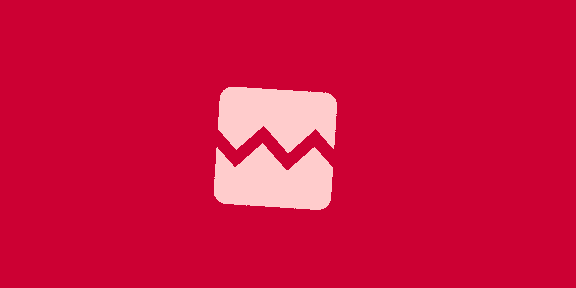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