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당신의 인생 훈장은 무엇입니까](https://img.hankyung.com/photo/202511/07.42357927.1.jpg)
나는 택시를 탈 때마다 기사님과 이야기를 나눈다. 처음엔 일상적인 대화로 시작하지만 어느새 삶 깊은 곳의 이야기로 흘러가곤 한다. 그럴 때면 자주 등장하는 주제 하나가 있다. ‘자랑’이다. 물론 모든 기사님이 그렇지는 않다. 가끔 몇몇 기사님이 조심스럽게 본인 자랑거리를 꺼낼 때가 있다. 자식 자랑이 가장 자주 등장한다. “우리 아들은 대기업 다녀요.” “딸은 미국에서 유학 마치고 지금 실리콘밸리에 있어요.” 어떤 분은 오래 일해서 어렵게 마련한 재산에 대해 소소하게 말씀하신다. “지방에 땅도 조금 있죠.”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면 자기 자랑을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아마 나 말고도 여러 손님에게 자랑과 무용담을 늘어놓으셨으리라. 자랑이 꼭 나쁘게만 들리지는 않는다. 반복해서 듣다 보면 주렁주렁 달린 훈장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노병의 모습이 떠오른다. 그러면서 사람은 결국 자기 나름의 훈장을 간직하고, 그 훈장으로 본인의 존재를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생각이 든다.
자식, 축적한 재산, 건강, 과거의 명성 등 지금껏 살아온 삶의 결과물은 우리 가슴에 달린 훈장들이다. 자신이 살아온 시간에 대한 증명이고, 스스로 잘 살아냈다고 느끼게 해주는 작은 증표다. 훈장을 얻기 위해 쏟아부은 노력과 열정은 어디선가 인정받고 기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기사님들의 자랑을 들을 때마다 부럽고 대단하다며 맞장구를 쳐준다.
나도 나에게 묻게 된다. “나는 내 인생의 훈장을 뭐로 삼고 싶지?” “내가 당장 내일 죽는다면 내 무덤에 어떤 훈장을 가지고 가지?” 내 훈장이 될 수 있는 물건들을 집에서 찾아본다. 아이들이 용돈으로 사준 선물, 예전 베트남 직원들이 퇴사 날 정성스럽게 만들어준 편지 모음, 가족사진 앨범, 산악마라톤 70K 완주 기념품, 러닝 앱 마일리지 등일 것 같다. 골프 이글패, 회사 직위가 적힌 명함, 통장, 자동차 키는 아마 무덤에 들고 가지 않을 것 같다.
내 무덤에 갖고 갈 물품은 나중에 누군가가 발굴했을 때 “이곳 주인은 이런 사람이었소”라고 말해줄 증표다. 남들이 나를 인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나만의 기준으로 나다움을 말해줄 수 있는 증표가 중요하다. 크고 거창하지 않아도 좋다. 내가 나다워질 수 있고 스스로 자랑스러워할 수 있다면 훌륭한 훈장이다.
오늘도 4.3㎡ 공간에서 울려 퍼질 택시 기사님들의 자랑은 자신의 인생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방식이다. 그러면서 나는 삶의 어떤 훈장들을 쌓으려고 이렇게 바쁘게 사는지 생각해 본다. 그리고 나한테 의미 있는 삶의 훈장들을 남기기 위해 내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는지 삶의 방향성도 재점검해본다. 그것이야말로 삶을 조금 더 재미있게, 조금 더 알차게 살게 해주는 방법이 아닐까.

 2 weeks ago
7
2 weeks ago
7
![[이소연의 시적인 순간] 내가 가장 먼저 안 '첫눈'](https://static.hankyung.com/img/logo/logo-news-sns.png?v=20201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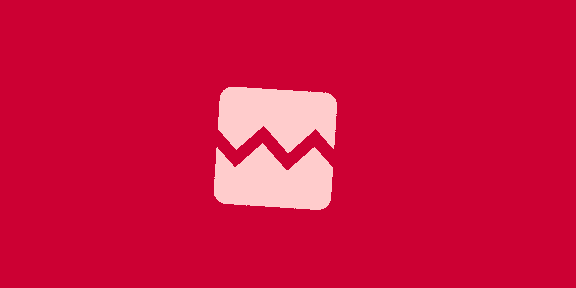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